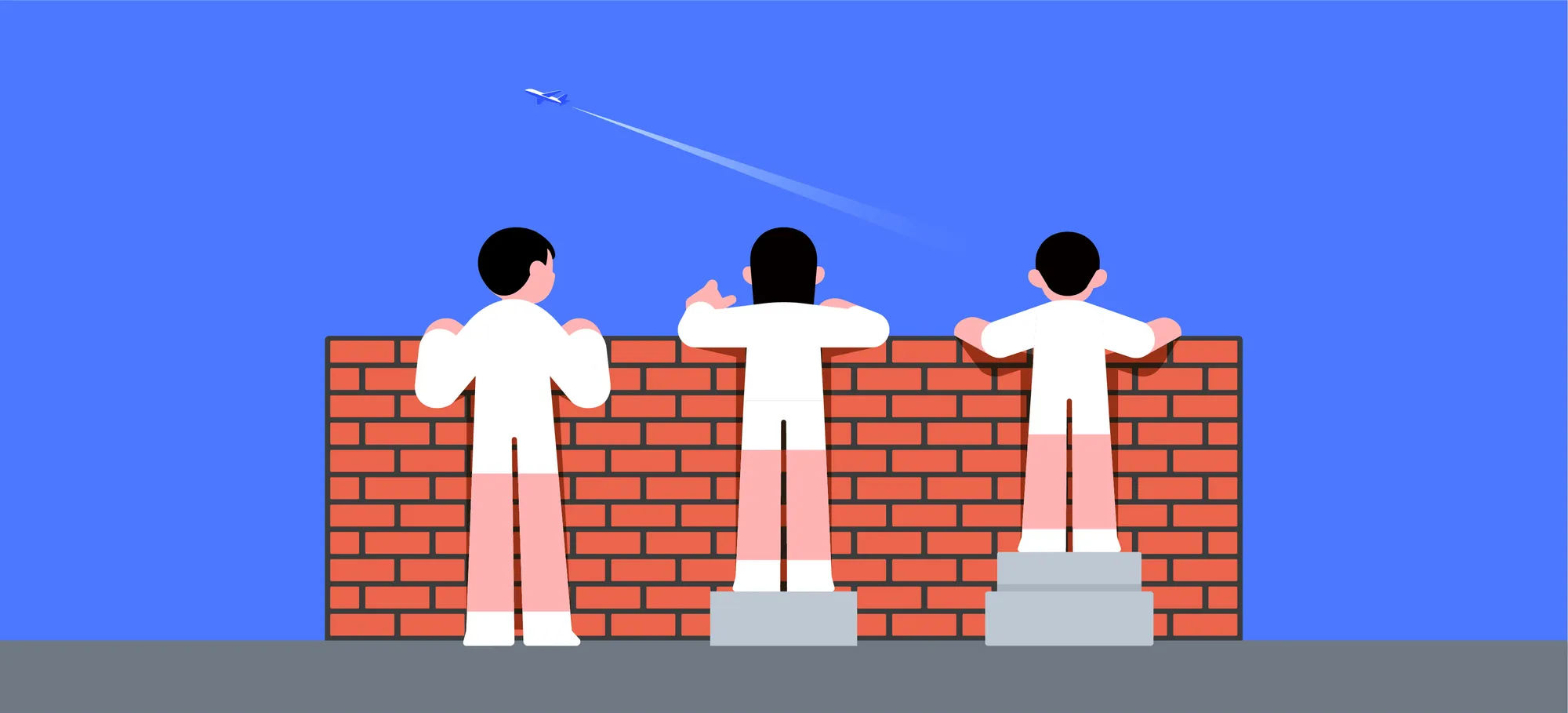“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그 말을 매일 반복하는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른다. 일을 한다는 이유로, 아이 곁에 없었다는 이유로, ‘미안하다’는 말은 얼마나 자주 반복되고 있을까.
여성의 교육 수준과 사회 참여가 크게 늘면서 ‘워킹맘’은 이제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되었다. 하지만 사회는 여전히 엄마를 ‘주양육자’로 기대한다. 이 간극은 조용한 불이익이 되어 일상 속에 스며든다. 장시간 야근과 회식이 성실함의 기준으로 내세우는 직장에서 시간제 근무라도 택하면 ‘의욕이 부족한 사람’으로 전락한다. 일과 돌봄을 병행하는 선택은 지금도 예외처럼 여겨진다.
이런 인식은 조세 제도에도 스며 있다. 대표적으로, 소득세법은 한 사람이 소득을 벌고, 다른 사람이 가정을 책임지는 1인 부양자 모델을 전제로 한다. 또한, 맞벌이 가정이 양육·간병·가사 노동을 외주화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세제 혜택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는다. 무급 돌봄을 중심에 둔 가족 모델의 관점이 제도 설계에 반영된 결과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출산과 육아는 자연스러운 생애 과정이 아닌, 개인이 감수할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진다.
이처럼 제도가 변화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생긴 간극은 여성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그 구조는 사회적 약자에게 반복적으로 불이익을 안긴다. 복잡하고 난해한 설계 속에서,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자신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조차 파악하기 어렵다. 결국 합법적 절세는 잘 아는 사람만의 권리가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신에게 허용된 권리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불이익을 감수하게 된다.
구조적 문제를 바꾸는 첫걸음은 제도의 불완전성과 불균형을 세심하게 ‘인식’하고, 복잡성을 ‘인정’하는 데 있다. 그래야 현실을 가리는 관성을 벗겨내고, 제도가 놓친 삶의 결을 다시 설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돌봄을 비용으로 인정하고, 가족의 형태를 다양하게 상정하며, 육아의 부담을 사회가 함께 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일.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향해 첫걸음을 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조세는 본질적으로 복잡하다. 그래서 두 번째 해법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제도를 해석하고 권리를 쉽게 설명하는 것이다. “이런 지출은 공제 대상입니다”, “이번 달 예상 세금은 얼마입니다”,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은 이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맥락에 맞는 안내가 자동으로 제공된다면, 비전문가도 자신의 권리를 놓치지 않게 된다. 특히 시간과 정보 접근이 제한된 이들에게 기술은,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같은 출발선에 세우는 것이 공정함이었던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는 서로 다른 조건을 조율하며, 각자의 위치에서 공정함을 설계해야 할 때다. 이때 조세 제도는 기회의 격차를 조정하는 수단이고, 인공지능은 복잡한 제도를 더 많은 이들이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 둘이 조화롭게 설계되고 작동할 때, 우리는 지금보다 덜 불공정한 사회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으리라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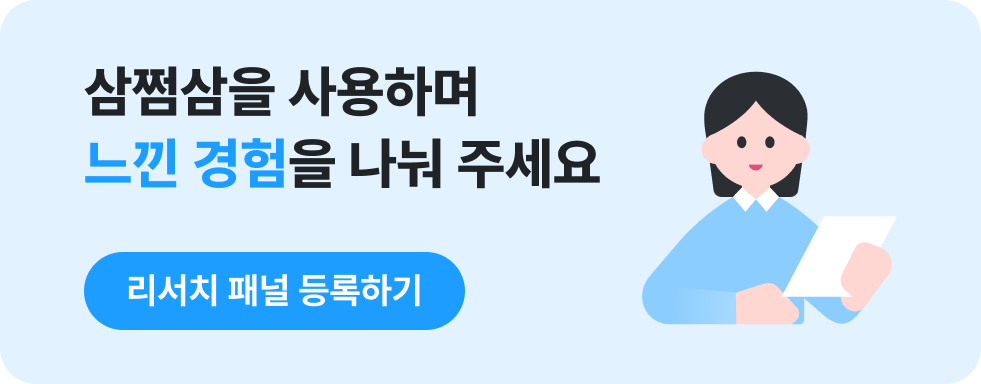
* 본 글은 사단법인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발행한 『워킹우먼(THE WORKING WOMAN)』 2025년 여름호(vol.7)에 실린 기고문입니다.
*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삼쩜삼 리서치랩에 있으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사용을 금합니다. 내용을 인용·가공·공유할 경우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