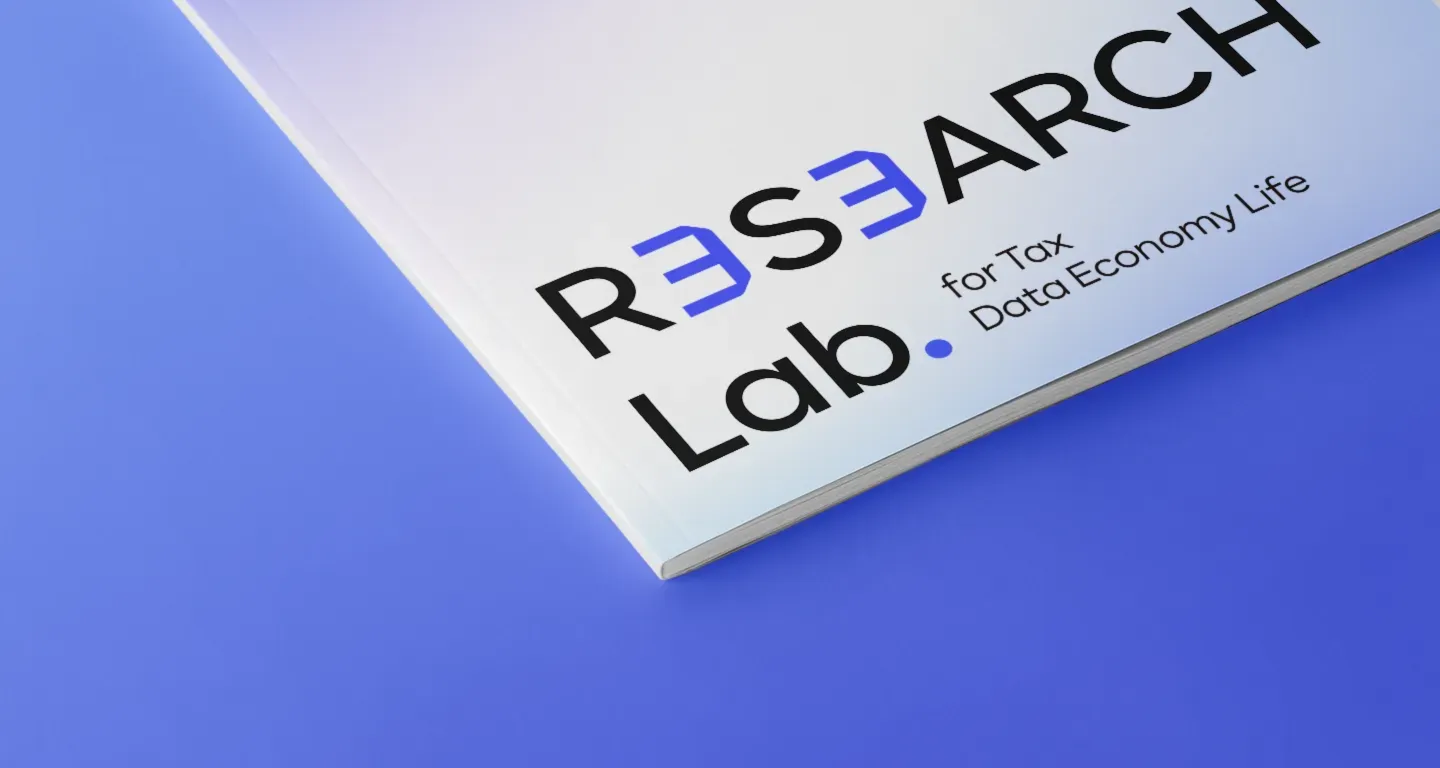세무직역 플랫폼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손쉽게 도와준다. 납세자 누구나 세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신고 자동화와 환급 지원으로 조세 행정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그러나 세무직역 플랫폼이 확산되면서 제도적 불확실성과 직역 갈등이 불거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결과 플랫폼은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큰 효과를 가져왔다. 국가적 차원에서 지난 2년간 환급금 5,225억 원이 발생했다. 행정비용은 53억 원 절감됐다. 소비 진작과 승수 효과는 1조 2,549억 원으로 추산된다. 총효익은 1조 7,827억 원에 달한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8,913억 원이다.
국민적 차원에서도 긍정적이다. 저소득자 277만 명이 평균 2.6만 원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했다. 이를 통해 약 2,216억 원의 절감 효과가 생겼다. 세금에 대한 인식 개선 효과도 뒤따랐다. 납세 편의가 실제로 권리 향상으로 이어진 셈이다.
장기 전망도 밝다. Bass 확산모델에 따르면 2029년에는 잠재고객 1,265만 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도 삼쩜삼의 점유율은 약 63.7%로 추정된다. 만약 이러한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어떨까. 국민이 환급받지 못하는 소득세 손실은 약 6.8조 원이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21조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는 플랫폼이 장기적으로 창출할 효익의 크기를 보여준다.
세무직역 플랫폼은 기존 세무사 시장과도 보완적 관계를 형성한다. 이용자의 90% 이상이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이다. 기존 세무사 고객과 크게 겹치지 않는다. 오히려 세금 신고 경험을 확산시켜 장기적으로 세무 서비스 수요 기반을 넓힌다. 저소득층 중심이었던 고객층도 점차 확대될 수 있다. 근로소득 외에 부가적 소득이 있는 납세자,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놓친 사람들 역시 플랫폼을 통해 혜택을 얻는다.
플랫폼 간 경쟁은 서비스 가격을 낮추고 품질을 높인다. 소비자 잉여가 증가하고, 젊은 전문가들의 시장 진입 기회도 넓어진다. 해외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미국 스트리밍 시장에서는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등 다양한 플랫폼이 경쟁하며 사용자층을 크게 확장시켰다. 세무직역 플랫폼도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
다만, 관 주도의 별도 플랫폼은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개발·운영 비용은 크지만 서비스 품질이 낮으면 이용률이 떨어질 수 있다. 실제 공공앱의 낮은 활용률 사례가 이를 보여준다. 따라서 세무 서비스처럼 전문성과 신뢰가 핵심인 영역에서는 민간 주도가 더 효과적이다. 정부는 직접 서비스를 운영하기보다, 민간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 타당하다.
결론적으로 세무직역 플랫폼은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적 효익을 창출한다. 이미 단기간에 1조 원이 넘는 사회적 효과를 입증했다. 장기적으로는 수십 조 원 규모의 편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 발전 방향은 민간 플랫폼 주도의 경쟁 구조에 두는 것이 합리적이다. 정부는 지원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할 때 세무 서비스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